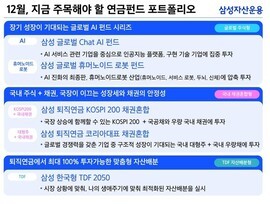[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국내·외 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대형항공사(FSC·Full Service Carrier)와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간 하늘길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점유율 경쟁에서는 LCC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장거리·서비스·재무 안정성 등에서는 FSC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양측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들은 항공권 가격, 서비스 품질, 노선 다양성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FSC와 LCC가 서로간 명확한 사업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중ㆍ단거리를 넘어 장거리 노선 일부에서까지 경쟁이 겹치며 ‘고객 경험 차별화’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최근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일반석)의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좌석을 도입, LCC들이 호령하고 있는 중단거리 노선에 개편된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 도입을 위해 일반석을 기존 3-3-3 배열에서 3-4-3 배열로 바꿨고, 이로 인해 일반석 너비는 약 46cm(18.1인치)에서 약 43cm(17인치)로 3cm가량 줄었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일반석 공간을 줄여 고급 좌석을 만든 셈이어서 ‘자사 고급화 전략의 대가를 일반석 승객이 떠안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인기가 시들하던 일등석도 8석을 없애며 수익성 극대화에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FSC로 대변되는 국적 항공사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LCC와의 사업 영역이 일부 겹치면서 위기감을 느낀 대한항공 측이 무리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FSC와 LCC 간 치열한 경쟁구도는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총 4582만96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LCC 8개사(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의 국제선 점유율은 34.4%(1578만1630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34.2%(1565만6395명)를 기록했다.
양측간 국제선 점유율은 불과 0.2%p(포인트) 차이지만 LCC가 3년 연속 FSC를 추월했다는 점은 대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수치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추세를 살며보면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 지난해 상반기 LCC의 국제선 점유율은 35.7%, FSC는 33.1%로 격차가 2.6%p였는데, 올해는 격차가 0%대로 줄었다.
이는 FSC 국제선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6% 늘어난 1565만명으로 급반등한 반면, LCC는 3.4%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 FSC·LCC, 각자 무기 앞세워 고객 유치 전쟁
현재 국내 항공시장은 장거리·비즈니스 수요는 FSC가, 단거리·가성비 수요는 LCC가 흡수하는 구도로 경쟁 영역이 뚜렷이 나눠진 상황이다.
다만 LCC가 가성비를 내세우며 중장거리뿐 아니라 미주 등 장거리 노선까지 커버할 수 있는 기종을 속속 도입, 호시탐탐 FSC 영역을 침투해들어가면서 양자 간 노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다.
FSC의 경우 ‘한 지붕 두 가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장거리 여행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주와 유럽 주요 노선에서 기내식·무료 수하물(23kg×2개)·개인별 엔터테인먼트(좌석 모니터) 등을 제공하며 장거리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해 왔다. 좌석 간격도 평균 32인치로 LCC보다 넉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식 기내식, 아동·유아용 서비스로 가족 여행객을 공략하고 있다. 두 항공사 모두 글로벌 동맹체(대한항공–스카이팀, 아시아나–스타얼라이언스)에 소속돼 환승 네트워크와 마일리지 활용성이 높은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서비스 안정성도 FSC의 대표적 경쟁력이라 할만 하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FSC는 지연·결항시 대체편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소비자 신뢰가 높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FSC는 상대적 강세를 보인다. 고유가·환율 부담 속에서도 장거리 프리미엄 좌석과 화물 수송 덕분에 손익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공항을 허브로 하는 환승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FSC만의 수익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LCC는 ‘합리적 가격’과 ‘노선 다변화’라는 무기를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항공은 매년 ‘찜 특가’로 편도 1만원대 국제선 항공권을 내놓으며 젊은 세대와 가족 여행객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진에어는 대형기 B777을 투입해 국제선 노선 경쟁력을 확보했고, 티웨이 역시 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으로 에어버스 A330-200 등의 기종을 도입해 인천–시드니, 인천–자카르타 등 중장거리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방공항의 활용도 LCC의 장점이다. 김포·김해·청주·대구 등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확대해 지방 거주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단순히 싼 가격뿐 아니라 가까운 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은 LCC의 매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수익성 악화는 LCC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공급 과잉과 환율·유가 부담 속에서 올해 2분기 LCC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했다. 제주항공 -419억원, 티웨이 -790억원, 진에어 -423억원, 에어부산 -111억원 등 하나같이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 FSC·LCC 각자 강점 내세워 격돌…승자는 결국 소비자
업계는 FSC와 LCC가 당분간은 각자 영역에서 강점을 발휘하되, 중장거리 시장에서 경계가 허물어지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하늘길 경쟁은 단순 점유율 싸움을 넘어 고객 경험 및 서비스 제고라는 '가치 대결'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FSC인 대한항공이 예상되는 논란에도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신설한 것이나 LCC인 에어프레미아가 가성비는 가져가면서 장거리 노선을 늘리고 프리미엄 좌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에어프레미아는 LCC를 넘어 HSC(Hybrid Service Carrier)를 표방하며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뉴욕 등 장거리 노선을 저렴한 가격과 와이드 프리미엄(좌석 간격 42인치) 좌석으로 공략하는 등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도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태생이 LCC인 만큼 기단 규모가 작아 지연 · 결항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점도 지적되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FSC와 LCC의 지향점이 명확한 만큼 타깃 층이 겹치는 영역에서 양측이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다만 하늘길 경쟁이 심화될수록 소비자는 더 많은 옵션 속에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항공사를 고를 수 있게 돼 소비자후생 측면에선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 대한항공 ‘프리미엄 이코노미’ 도입 논란… 소비자 불편 우려
- 격변기 맞은 항공업계… 신생 LCC 3사 과제는?
- 성수기에도 못 웃는 LCC…'출혈 경쟁'에 수익성 뒷걸음
- 올해 상반기 국적 항공사 여객수 100만명 '뚝'…항공 사고 영향 탓
- '6일 연휴' 5월, 여객 증가 '찔끔'…LCC 사고 영향
- 티웨이, 캐나다 밴쿠버 노선 신규 취항…LCC 중 최초
- 대한항공, 70조원 대미 투자계획 발표…“보잉 항공기 103대‧예비엔진 도입”
- 추석 연휴동안 인천공항 '이상무'? …노조 파업 예고에 '업무마비' 우려 확산돼
- 진에어, 창립 17년만에 누적 탑승객 1억명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