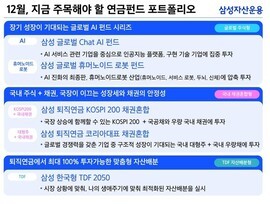[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공무원 시험 수석 합격자들의 부처 선택 기준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규모가 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을 선호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미래 가치가 높은 신흥 규제·디지털 분야 기관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수영 사무관은 16주간의 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지난 9월 말 수습 사무관으로 본격적인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최 사무관은 2023년 5급 공채(일반행정)와 입법고시 양과 수석을 동시에 달성한 인재로, 첫 근무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선택해 공직사회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 사무관은 현재 개인정보위 혁신기획담당관 소속으로 근무 중이다. 이 부서는 부처의 기획·업무계획을 총괄하며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조직으로 꼽힌다.
그는 주변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었다. 개인정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영역이라고 판단해 지원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선택은 전통적 행정직 수석들의 행보와 대비된다. 일반적으로 일반행정 수석들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대형 부처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수석=대형 부처”라는 기존 공식을 흔드는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1처 4국 16과, 정원 174명 규모로 여타 부처에 비해 작은 조직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며 개인정보위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어 KT·GS리테일·롯데카드 등 굵직한 기업들의 유출 사건도 잇달아 조사하며 규제기관으로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젊은 사무관들 사이에서 개인정보위의 인기가 차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대부분 세종시 근무인 다른 중앙부처와 달리 ‘서울 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 특성상 신임 사무관도 정책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아울러 AI·디지털 시대 핵심 영역인 개인정보·디지털 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신임 사무관 정원(TO)은 많지 않지만 점수가 높은 상위권 사무관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미래 성장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디지털 규제 업무는 민간에서도 수요가 높은 분야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퇴직 후 로펌 등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