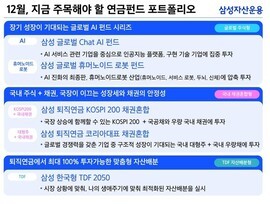[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줄곧 친환경 정책을 주창해온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인 해상풍력 시장도 가열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 진작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작 미국은 제조에 서툴러 우리나라 등 타국으로 수혜가 옮겨 갈 것으로 점쳐진다.
![해상풍력설치선 [사진=utoimage]](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2011/40284_37525_5728.jpg)
터빈 수천 기 꽂아야 하는 초대형 시장 열려
바이든의 2조2,000억 규모의 친환경에너지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바다 곳곳에 수천 기의 해상풍력 터빈이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설치 목표량이 가장 많은 뉴욕주(9GW)를 중심으로 미국 북동부 연안주들에서 수십 GW급 풍력단지가 구축된다.
바이든은 해상풍력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탄소제로 전환 촉진제라고 강조해 왔다. 컨설팅 업체 ‘Wood Mackenzie’는 바이든이 승기를 쥐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치 용량이 30%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밋빛 전망에 Orsted, Vestas, BP 등 해상풍력 관련 굴지의 기업들이 상종가를 날리고 있다. 또한, 수백 척의 해상풍력설치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의 조선소도 기대감에 부풀었다. 미국조선협회(Shipbuilders Council of America)는 “이것은 한 세대에 걸쳐 등장한 가장 큰 시장이다”고 반겼다.
손 놓고 있던 조선업, 풍력에 서툴러
해상풍력 투자 비용의 30%를 세액공제 해주는 생산세액공제(PTC), 투자세액공제(ITC) 도입에 대한 요구에 힘이 실리는 등 업계는 이번 기회가 온전히 자국민에게 향하길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그간 업계가 해상풍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었고 지금은 글로벌 무대 뒤로 밀려난 형국이다. 모노파일(monopile), 기어박스 등 풍력터빈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달린다.
풍력터빈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은 고용 창출 효과가 확실한 조선분야는 내줄 수 없다며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연방법상 해상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의 존스 법(Jones Act)이 공고하게 버티고 있다. 미국 항만 간 물자를 실어 나르는 선박은 미국 시민이나 영구 거주자에 의해 건조·등록·소유돼야 하며, 선원 75%도 그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법 폐지 압박이 거셌지만 안보 등의 이유로 업계는 이법을 지켜냈다.
이외에도 미국은 줄곧 조선업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호주, 카타르에 이어 세계 3위의 LNG 수출국으로서 미국의 조선업계는 청신호가 켜진 LNG운반선 시장을 알아보고 자국 선박 확충으로 침체된 조선업을 활성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해 John Garamendi 하원의원과 Roger Wicker 상원의원이 ‘미국선박법(Energizing American Shipbuilding Act)’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John Garamendi 하원의원은 “전세계 LNG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선박은 2041년까지 전체 해상 LNG 수출의 15%를, 2033년까지 전체 해상 원유 수출의 10%를 차지하게 된다”며, “이 법안 통과로 선박 발주가 촉진돼 미국 내 조선소 및 기자재 산업이 가열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국조선협회는 이 법안 통과로 2041년까지 28척의 LNG운반선과 2033년까지 12척의 유조선, 총 40척여척을 건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oger Wicker 상원의원도 “미국이 국가비상 사태와 같은 유사시 석유와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자국 선대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연내 해상풍력설치선 수주가 유력하다. [사진=대우조선해양]](https://cdn.industrynews.co.kr/news/photo/202011/40284_37526_5813.png)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등 신호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이미 역량이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조선업계 관계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이미 서서히 쇠락한 미국 조선업은 해군력 때문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선업에서는 전문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에서 발달한 것이다. 모든 환경을 감안할 때 조선업 대반등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인이 그저 세몰이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조선업에 손 놓은 지 오래다. 1980년 이후 자국 선주들이 저렴하게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바람에 주요 조선소들은 셔텨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2018년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에만 약 2만여 개의 미국 선박 부품 업체들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저 앉은 조선업이 단기간에 역량을 확보해 해상풍력설치선을 건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시각이다. 해상풍력설치선은 잭업리그(Jack-up Rig)를 내려 해저에 고정한 뒤 선박위치제어시스템(Dynamic Positioning)으로 일정 파도에서도 제자리를 지켜야 하는 특수목적선이다.
이에 거친 북해에서 고군부투하며 해양플랜트 노하우를 축적한 유럽 국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Responsible Offshore Development Alliance(RODA)’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에서 8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대부분 유럽에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자국민들에게는 2030년까지 완성된 터빈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따른 약 5,000~7,000개의 일자리 창출 정도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건조 경험이 풍부한데다 가격 경쟁력도 갖춘 우리나라도 수혜국으로 유력하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해상풍력설치선 건조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1조원 규모 해상풍력설치선을 조만간 수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막 오른 바이든 시대… LS일렉트릭, 공들인 스마트그리드로 비상할 채비
- 삼성중공업, DNV GL 선급과 대형 해상풍력 부유체 개발 나선다
- 꽁꽁 언 조선경기에도 사업 열기 ‘후끈’한 기업들
-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2위’ 미국, 재생에너지 통해 오명 벗나
- 산단공, 산업계 최초 조선해양 온라인전시회 개최… 부울경 중소업체 활력 제고 기대
- 아마존, 오스테드 추진하는 독일 최대 해상풍력단지서 전력수급키로
- 정통 탱커·벌크선 선사 해상풍력사업으로 체질전환 ‘시동’
- Crowley, 해상풍력발전 턴키(Turn-key) 공급으로 자국 시장 공략에 나서
- 지멘스, 해상풍력-수소생산 연구개발에 1억5천만 달러 투자 발표
- 美 세계 최대 3D프린터로 해상풍력 날개 제조 나선다
- Kongsberg, 미국 최초 풍력설치선박에 핵심장비 공급